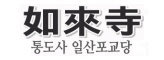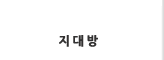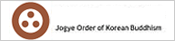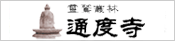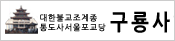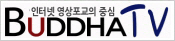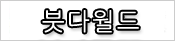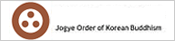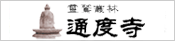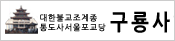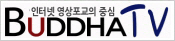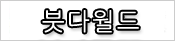십이인연 (十二因緣)
무명 I 행 I 식 I 명색 I 육입 I
촉 I 수 I 애 I 취 I 유 I 생 I 노사

▩ 십이인연 (十二因緣)
|
12인연은 부처님께서 일체제법(一切諸法)의
실상(實相)을 밝히고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을 끊어 윤회와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도록 가르치신 연기법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이다. 이는 유정(有情)들의 연기(緣起)를
논하고 있으며 윤회사상(輪廻思想)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12인연법은 부처님께서 성도(成道)와
함께 자각(自覺)하여 발견하신 연기의 도리(諸法의 實相)로서
생(生)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정연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생사(生死)가 없는 경지를 실증(實證)하고 생사가 무엇으로
인하여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밝히며 그것의 소멸(消滅)과
소멸의 법을 밝힌 것이다.
아함경의 여러 곳에서 이 12인연법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
이것이 인하여 저것이 일어난다.
(此起故彼起)
이것을 인하여 저것이 있고
(因此有彼)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無此無彼)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此生彼生)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此滅彼滅)
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인하여 식이 있으며, 식에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에 연하여
육입이 있으며, 육입에 연하여 수가 있고 수에 연하여 애가
있으며, 애에 연하여 취가 있고 취가 연하여 유가 있으며,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우비고뇌가 생한다.
무명이 멸하므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므로 식이 멸하고, ……, 유가 멸하므로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므로 노사우비고뇌가 멸한다.
이러한 예문에서 볼 때, 부처님께서
12인연을 설하신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상의상자(相依相資)하는
연기를 자각케 하고 윤회에서 해탈케 하기 위하여 생사윤회의
발생과정과 소멸과정을 설하고 계시는 것이다. |
 
① 무명 (無明)
|
무명(無明)이란 정법(正法)에
대한 무지(無知)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사성제(四聖諦)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올바른 세계관(世界觀)과
인생관(人生觀)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苦)가 발생하게 된다.
고(苦)의 시작은 무명(無明)에서부터
이므로, 무명은 모든 고(苦)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
 
② 행 (行)
|
무명(無明)에 의하여 행(行)이
있다. 행이란 행위(行爲), 즉 업(業)을 가리킨다. 사고작용(意行)·언어작용(語行·口行)·신체의
동작(身行)으로 구별되며 선악(善惡)의 의지를 수반한다.
업(業)은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無明) 때문에 짓게
된다.
행(行), 즉 업(業)은 뒤에 잠재적인
힘의 형태로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
 
③ 식 (識)
|
행(行)에 의하여 식(識)이 있다.
식이란 표면적인 의식작용(意識作用)까지를 말한다.
초기경전에서는 잠재의식에
대해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식(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생각하지 않고서 ‘행(行)에 의하여 식(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꽃을 볼 경우에
꽃이라는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전에 꽃을 본 경험이
잠재의식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현재의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행(行)에 의하여 식(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
 
④ 명색
(名色)
|
식(識)에 의하여 명색(名色)이
있다. 여기서 명(名)이란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고, 색(色)이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결국 명색(名色)은 일체법(一切法)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법은 인식(認識)의 대상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 인식의 대상인
일체법을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을
육경(六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식(識)에 의하여
명색(名色)이 있다’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음 항(項)인 육입(六入)과 함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⑤ 육입 (六入)
|
명색(名色)에 의하여 육입(六入)이
있다. 육입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의 육종감각기관(六種感覺器官), 즉 육근(六根)이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능력(感覺能力)까지를
가리킨다. 인식작용이 있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 등 삼지(三支)는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로 놓여진다고 하기보다는 동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식(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명색(六境)과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인
육입(六入)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12인연에서는
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의 삼지(三支)가 동시적으로
놓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
 
⑥ 촉 (觸)
|
육입(六入)에 의해서 촉(觸)이
있다. 촉이란 지각(知覺)을 촉발시키는 심적인 힘이다.
이것은 육입(六入)에 의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육입만에 의해서가 아니고 식(識)·명색(名色,
六境)·육입(六入·六根) 등 삼지(三支)가 모임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잡아함경에서 ‘삼사화합성촉(三事和合成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⑦ 수 (受)
|
촉(觸)에 의해서 수(受)가 있다.
수란 좋아하는 감정(樂受), 싫어하는 감정(苦受) 등을 말한다.
감각기관(六根)과 그 대상(六境), 그리고 인식작용(識)
등 삼요소(三要素)가 만날 때 거기에 지각(知覺)을 촉발시키는
‘심적인 힘(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수(受)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受)는 촉(觸)에 의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
 
⑧ 애 (愛)
|
수(受)에 의해서 애(愛)가 있다.
애란 갈애(渴愛)로써 욕망을 말한다. 좋아하는 것을 만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애착(愛着)과 증오(憎惡)를
일으키게 된다. 증오 역시 애(愛)의 일종이다. 고(苦)·락(樂)
등의 감수작용(感受作用)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애(愛)와 증오(憎惡)도 커진다. 무명(無明)이 고(苦)의
근본 뿌리라고 한다면 애(愛), 즉 욕망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뿌리이다. 그러나 무명(無明)보다도 직접적이고 훨씬 적극적인
고(苦)의 원인이다. |
 
⑨ 취 (取)
|
애(愛)에 의하여 취(取)가 있다.
취는 취착(取着)의 의미로써, 올바르지 못한 집착이다.
맹목적인 애증(愛憎)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애착(愛着)을
가리킨다. |
 
⑩ 유 (有)
|
취(取)에 의하여 유(有)가 있다.
유란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보설(業報說)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존재(有)한 선악의 행위로서의 존재(業有)와
그 업에서 맺어지는 결과인 고락 등 과보로서의 존재(報有)가
있다. 욕망(愛)과 집착(取)의 결과로서 지어진 업(業)이
쌓여서 잠재력(業力)으로 된 것으로 이 잠재력, 즉 업력이
현재와 미래의 생(生)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
 
⑪ 생 (生)
|
유(有)에 의하여 생(生)이 생긴다.
유는 존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업(業)의
결과로서 생(生)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生)은 현재의
생(生)이라고도 할 수 있다. |
 
⑫ 노사 (老死)
|
생(生)에 의하여 노사(老死)
등 여러 가지 고(苦)가 있다. 즉 존재의 발생, 즉 생(生)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고, 모든 고(苦)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
석존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12연기를 순(順)·역(逆)으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여의셨는데, 순관(順觀)은 무명에서 노사의 방향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역관(逆觀)은 노사에서 무명의 방향으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순역 두 관찰에서 부처님들께서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는 먼저 역관에 의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인 괴로움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현실적인 괴로움이란
바로 12지의 마지막인 노사의 괴로움이다.
이 십이인연을 삼세양중(三世兩重)의
인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한다.
※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 |
 
|